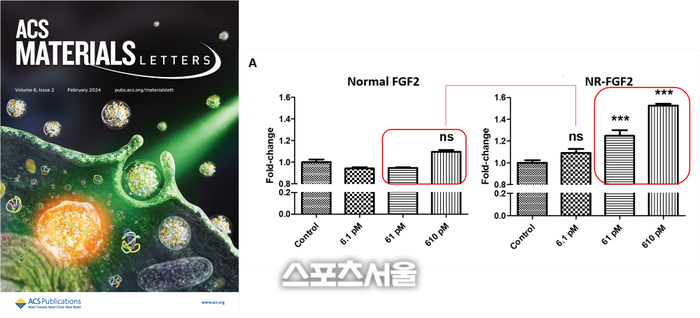[사진=장원영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장원영 인스타그램 캡쳐] 두바이 쫀득 쿠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국 디저트 전문점마다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개점과 동시에 물량이 소진되는 이른바 '오픈런'이 일상화됐다.
'두쫀쿠'는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로,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착안해 국내에서 재해석된 디저트다.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가늘게 가공한 중동식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 속을 만든 뒤, 코코아 가루를 더한 마시멜로로 감싸 완성한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말랑하고 쫀득한 식감으로, 쿠키라기보다는 떡에 가까운 형태다.
이 열풍에 불을 지핀 계기는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해 9월 SNS에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부터다. 이후 인스타그램에는 '#두쫀쿠' 해시태그 게시물이 3만 건을 넘어섰고, CU가 출시한 관련 상품은 누적 판매량 180만 개를 돌파하며 연일 품절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두쫀쿠' 판매점들은 하루 수백 개에서 많게는 1천 개 이상을 판매하며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소비 침체 속에서도 매출을 견인하는 '효자 상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이달 첫 주 '두쫀쿠' 포장 주문 건수는 한 달 전보다 321% 급증했으며, 지난해 12월 검색량은 두 달 전 대비 25배 늘었다.
수요 급증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는 고환율과 맞물려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미국산 피스타치오 국제 시세는 파운드당 약 12달러로, 1년 전보다 1.5배가량 뛰었다. 한 대형마트는 탈각 피스타치오(400g) 소비자가를 지난해 2만 원에서 올해 2만4000원으로 20% 인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업종을 가리지 않고 '두쫀쿠' 판매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디저트 카페와 베이커리는 물론 요거트 전문점, 샌드위치 가게, 분식집과 고깃집, 파스타 전문점까지 메뉴에 '두쫀쿠'를 올리고 있다. 일부 매장은 품절을 막기 위해 1인당 1~2개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토스는 매장별 '두쫀쿠'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까지 선보였다.
편의점 업계도 공급 조절에 나섰다. GS25는 ‘두바이쫀득초코볼’의 점포당 발주 수량을 2개로 제한했고, CU와 세븐일레븐 역시 각각 ‘두바이 쫀득 찹쌀떡’, ‘카다이프 쫀득볼’의 발주 물량을 동일하게 제한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사진=연합뉴스]
두바이 쫀득 쿠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두쫀쿠' 열풍의 배경으로 불황 속 소비 트렌드 변화를 꼽는다. 적은 비용으로 만족감을 얻는 '스몰 럭셔리', 소비와 기존 제품을 변형해 즐기는 '모디슈머' 문화, 여기에 SNS를 중심으로 한 '디토(Ditto) 소비'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인증이 확산되며 관심이 커졌고, 희소성이 소비 욕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두쫀쿠 한 개의 중량은 약 50~55g으로, 가격은 5000원에서 1만 원대에 형성돼 있다. 디저트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고물가 시대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디저트를 취급하지 않던 매장들도 '두쫀쿠'를 유인 상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메뉴명에 '두쫀쿠'를 붙여 주목도를 높이거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초밥집과 국밥집, 곱창집은 물론 철물점까지 판매 대열에 합류했다.
다만 이 같은 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원재료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가 논란과 함께 '원조 경쟁', '과도한 상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두쫀쿠'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정착하려면 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유영훈 기자 ygleader@ajunews.com

![[포토] 폭설에 밤 늦게까지 도로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000920610800.jpg)

![[포토] 국회 예결위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0410898931_1762479667.jpg)
![[포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앞두고 팝업스토어 오픈](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4160199219_1762492560.jpg)
![[포토] 예지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화보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82431778689.jpg)

![[포토]두산 안재석, 관중석 들썩이게 한 끝내기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1a1c4d0be7434f6b80434dced03368c0_P1.jpg)

![[작아진 호랑이③] 9위 추락 시 KBO 최초…승리의 여신 떠난 자리, KIA를 덮친 '우승 징크스'](http://www.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8238.jpg)
![블랙핑크 제니, 최강매력!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ed1b2684d2d64e359332640e38dac841_P1.jpg)
![[포토]첫 타석부터 안타 치는 LG 문성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2/news-p.v1.20250902.8962276ed11c468c90062ee85072fa38_P1.jpg)
![[포토] 아홉 '신나는 컴백 무대'](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514134.jpg)
![블랙핑크 제니, 매력이 넘쳐!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c5a971a36b494f9fb24aea8cccf6816f_P1.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하늘 '완벽한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457.jpg)
![[포토]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9369.jpg)

![[포토] 박지현 '순백의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414.jpg)
![[포토] 김고은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236.jpg)
![[포토] 발표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206916880.jpg)
![[포토] 언론 현업단체, "시민피해구제 확대 찬성, 권력감시 약화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23135571578.jpg)
![[포토] '삼양1963 런칭 쇼케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008977281.jpg)
![[포토] 김고은 '상연 생각에 눈물이 흘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613.jpg)
![[포토]끝내기 안타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산 안재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0df70b9fa54d4610990f1b34c08c6a63_P1.jpg)
![[포토]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 리뉴얼 오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42544910604.jpg)

![[포토] 아이들 소연 '매력적인 눈빛'](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492.jpg)
![[포토]두산 안재석, 연장 승부를 끝내는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b12bc405ed464d9db2c3d324c2491a1d_P1.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쥴리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3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