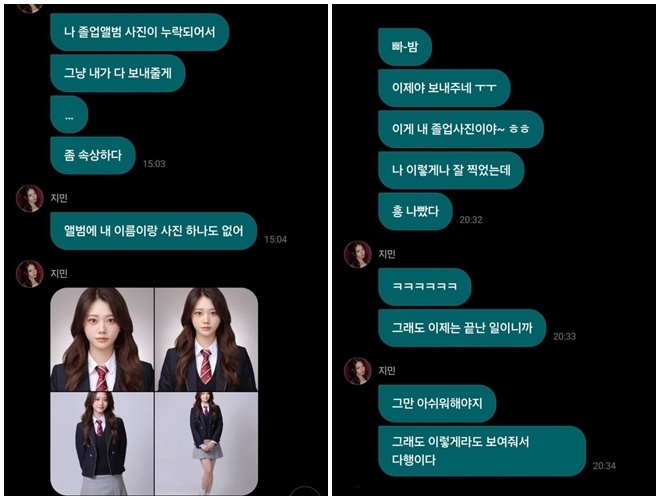요즘 부쩍 유명 연예인들의 부고 소식이 잦다. 뉴스를 켜면 어김없이 검은 리본이 달린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이름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잠시 멈춘다. 예전 같으면 놀라거나 안타까운 감정이 먼저였을 텐데, 요즘은 감정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 슬픔보다 앞서는 것은 묘한 낯섦이다. ‘이 사람도?’라는 생각이 먼저 스친 다음에야 서서히 실감이 따라온다.
요즘 부쩍 유명 연예인들의 부고 소식이 잦다. 뉴스를 켜면 어김없이 검은 리본이 달린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이름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잠시 멈춘다. 예전 같으면 놀라거나 안타까운 감정이 먼저였을 텐데, 요즘은 감정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 슬픔보다 앞서는 것은 묘한 낯섦이다. ‘이 사람도?’라는 생각이 먼저 스친 다음에야 서서히 실감이 따라온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생생하다. TV 속에서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연기하던 장면들은 아직도 또렷하다. 방송을 다시 틀면 여전히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시간에서 먼저 내려버렸다. 그래서 부고는 더 현실감이 없다. 사라졌다는 느낌보다는 나만 계속 같은 자리를 지나고 있는 기분이 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만은 아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냈던 우리의 시간이다. 특정 연예인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시절의 공기까지 함께 떠오른다. 그때의 집, 그때의 방, 그때의 TV 위치, 그때의 웃음소리. 그들이 화면에 나오던 시기에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누군가는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가족을 꾸리고 있었다. 그 얼굴들은 늘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너무 쉽게 ‘현재’라고 믿어버렸다.
부고 소식이 유독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라는 자각이 더 먼저 온다. 예전엔 연예인의 죽음이 어른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내 또래의 시간이 정리되는 느낌에 가깝다. 한 사람의 이름이 실린 부고는 사실 한 시대의 마침표에 더 가깝다.
그래서 요즘의 부고는 조용하다. 울음이 터지기보다는 멍해진다. 애도와 동시에 정리가 시작된다. 그 사람의 필모그래피를 훑어보며 나 자신의 시간을 함께 정리한다. 이때는 뭐 하고 살았더라, 이 노래를 들을 땐 어떤 마음이었더라, 그 예능을 보며 깔깔 웃던 날은 어떤 요일이었더라. 기억은 그렇게 개인의 연대기를 건드린다.
한 시대는 늘 이렇게 지나간다. 선언도 없고 카운트다운도 없다. 누군가 “이제 끝”이라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익숙했던 이름이 과거형으로 불리기 시작할 뿐이다. 우리는 그제야 깨닫는다. 아, 이 시절이 끝났구나.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작품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다시보기로 보고, 플레이리스트에 담기고, 추천 알고리즘에 뜬다. 그래서 죽음은 더 실감 나지 않는다. 화면 속에서는 영원히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데, 현실의 시간만 앞으로 밀려난다. 남은 사람들은 그 간극을 체감하며 나이를 먹는다.
부고 소식이 계속 마음에 남는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삶이 끝났다는 뉴스가 아니라 내가 지나온 길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뉴스 앞에서는 누구나 잠시 말을 아낀다. 위로의 문장을 찾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시간을 갖는다.
이제는 안다. 이별이 반드시 극적일 필요는 없다는 걸. 시대는 이렇게 조용히 바뀐다. 한 명씩, 하나씩, 익숙한 이름이 사라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과거를 붙잡고 울기보다는 그 시간을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쪽에 가깝다.
부고 기사는 그래서 늘 현재형으로 읽힌다. 떠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실은 남아 있는 사람의 시간표를 조정하는 기사다. 오늘의 나를 확인하게 만들고, 내일의 나를 상상하게 만든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기사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언젠가 어떤 이름과 함께 기억될 것인가. 한 시대는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고, 우리는 그 사실을 부고 기사 몇 줄로 뒤늦게 알아차린다.

![[포토] 폭설에 밤 늦게까지 도로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000920610800.jpg)

![[포토] 국회 예결위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0410898931_1762479667.jpg)
![[포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앞두고 팝업스토어 오픈](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4160199219_1762492560.jpg)

![[포토] 예지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화보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82431778689.jpg)

![[포토]두산 안재석, 관중석 들썩이게 한 끝내기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1a1c4d0be7434f6b80434dced03368c0_P1.jpg)
![[작아진 호랑이③] 9위 추락 시 KBO 최초…승리의 여신 떠난 자리, KIA를 덮친 '우승 징크스'](http://www.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8238.jpg)
![블랙핑크 제니, 최강매력!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ed1b2684d2d64e359332640e38dac841_P1.jpg)
![[포토]첫 타석부터 안타 치는 LG 문성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2/news-p.v1.20250902.8962276ed11c468c90062ee85072fa38_P1.jpg)
![블랙핑크 제니, 매력이 넘쳐!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c5a971a36b494f9fb24aea8cccf6816f_P1.jpg)
![[포토] 아홉 '신나는 컴백 무대'](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514134.jpg)
![[포토]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9369.jpg)

![[포토] 발표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206916880.jpg)
![[포토] 박지현 '순백의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414.jpg)
![[포토] 김고은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236.jpg)
![[포토] '삼양1963 런칭 쇼케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008977281.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하늘 '완벽한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457.jpg)
![[포토] 언론 현업단체, "시민피해구제 확대 찬성, 권력감시 약화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23135571578.jpg)

![[포토] 김고은 '상연 생각에 눈물이 흘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613.jpg)
![[포토]끝내기 안타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산 안재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0df70b9fa54d4610990f1b34c08c6a63_P1.jpg)
![[포토]두산 안재석, 연장 승부를 끝내는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b12bc405ed464d9db2c3d324c2491a1d_P1.jpg)
![[포토] 아이들 소연 '매력적인 눈빛'](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492.jpg)
![[포토]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 리뉴얼 오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42544910604.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쥴리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358.jpg)